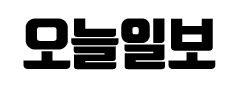- 대만과의 단교, 북한의 반발 속에서 펼쳐진 첩보작전 같은 비밀 협상
- 1992년 8월 24일, 적이었던 두 나라의 악수
한중수교는 냉전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이후 30여 년간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외교 혁명'이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의 조어대(釣魚台) 국빈관. 대한민국의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첸지천(錢其琛) 외교부장이 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굳은 악수를 나눴다.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 이 짧은 순간은, 40여 년간 이어진 동북아 냉전 체제의 견고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불과 42년 전, 한반도에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적국'이 모든 이념의 장벽을 넘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다.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가장 찬란한 성공으로 기록된 한중수교. 그러나 이 역사적인 악수의 이면에는 오랜 동맹이었던 대만과의 가슴 아픈 단교, 혈맹 북한의 거센 반발, 그리고 양국 외교관들이 펼쳤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비밀 협상이 숨어 있었다.
제1부: 얼어붙은 장벽, "죽의 장막" 너머의 두 나라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 관계였다. 우리는 중국을 '중공(中共)'이라 부르며 공산주의 팽창의 선봉으로 여겼고, 중국은 우리를 '남조선'이라 칭하며 미 제국주의의 괴뢰 정권으로 간주했다. 서울에는 중화민국, 즉 대만의 대사관이 있었고, 양국은 반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끈끈한 우방 관계를 유지했다. '죽의 장막' 너머의 두 나라는 수십 년간 어떠한 공식적인 교류도 없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만을 쌓아갔다.
이 얼어붙은 관계에 첫 균열이 생긴 것은 1983년 5월,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다. 중국 민항기가 공중 납치되어 춘천의 미군기지에 불시착한 것이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 민항총국장이 공식 직함을 들고 서울을 방문했고, 대한민국 외무부와 중국 정부 대표단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며 9일간의 협상을 벌였다. 비록 외교적 해프닝이었지만, 이는 양국 정부가 서로를 실체로 인정한 최초의 공식 접촉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제2부: 실리의 바람이 불다 - 노태우의 북방정책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냉전의 벽을 허무는 기폭제가 되었다. '화합과 전진'을 내세운 올림픽에는 중국, 소련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노태우 정부는 이념을 넘어 실리를 추구하는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서독이 '동방정책'으로 동독 및 동구권과 교류하며 통일의 기반을 닦았듯, 우리도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 소련과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자는 대담한 구상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필요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걷던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제 발전 경험은 중국에게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의 조건이었다. 1991년, 양국은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하며 사실상의 대사관 업무를 시작했다. 이념의 시대가 가고, 국익과 경제가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3부: 첩보전을 방불케 한 비밀 협상
본격적인 수교 협상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큰 난관은 단연 '대만 문제'였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할 것을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오랜 우방을 우리 손으로 내쳐야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당시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고려해 '선 수교, 후 단교'를 희망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대만 측에 수교 발표 불과 24시간 전에 단교 방침을 통보하는, 외교적으로는 비정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은 "한국은 신의 없는 나라"라며 격분했고, 타이베이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또 다른 난관은 '북한 문제'였다. 수십 년간 '순치보거(脣齒輔車, 입술과 이, 수레와 바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중국의 몫이었다. 첸지천 외교부장은 수교 발표 직전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에게 "중국도 국익을 위해 남조선과 수교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김일성은 "배신행위"라며 격노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북한은 이후 한동안 중국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깊은 배신감을 드러냈다.
제4부 결론: 동반자인가, 경쟁자인가? 30년의 동상이몽(同床異夢)
1992년의 역사적인 악수 이후, 한중 관계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은 30년 만에 3,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0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류(韓流)'는 중국 대륙을 휩쓸며 양국 국민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의 여정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보복,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문제,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상호보완적'이 아닌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때 같아 보였던 양국의 꿈은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동상이몽'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의 결단이 20세기 말 한국 외교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택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중수교는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국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증거다. 파트너이자 경쟁자로서 복잡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오늘, 30여 년 전 냉전의 벽을 넘었던 그 지혜와 용기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