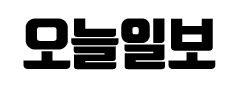- 당신의 '무진'은 어디이며, 그곳으로부터의 도피는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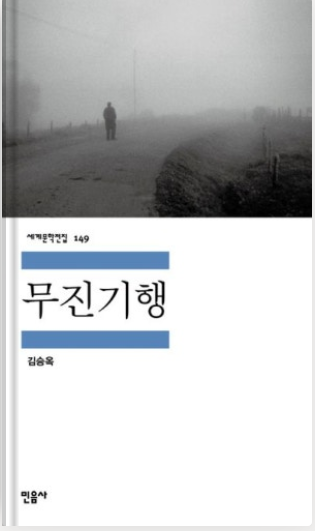
김승옥이 그려낸 1960년대 '감수성의 혁명'...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구원이 아닌 부끄러움이었다.
1960년대 한국 문학은 김승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소설 '무진기행'을 읽는 것은, 짙은 안갯속을 홀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경험이다. 그의 문장은 이전 세대의 작가들이 짊어졌던 전쟁의 상흔이나 이념의 무게 대신, 전후(戰後) 근대화의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미묘한 허무와 소외, 속물적 욕망과 자기혐오를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해냈다. '무진(霧津)', 즉 안개 나루. 이곳은 지도에 없는 허구의 공간이자,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모든 현대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심리적 도피처다. 주인공 윤희중의 짧은 귀향길을 따라가는 '무진기행'은, 일상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 얼마나 허망하며, 그 끝에 남는 것이 결국 '부끄러움'뿐임을 통찰한 우리 시대의 영원한 문제작이다.
안개 속으로의 며칠, 한 남자의 여정
1부: 성공이라는 감옥, 서울을 떠나다
소설은 제약회사 전무인 주인공 '나'(윤희중)가 아내의 권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인 '무진'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장인의 재력과 아내의 적극적인 처세 덕에 젊은 나이에 상류층으로 편입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성공의 안락함 대신,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무력감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에게 서울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감옥이며, 무진으로의 여정은 그 감옥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탈출, 즉 '도피'다.
2부: 안개의 도시, 무진에서의 만남
그가 도착한 무진은 명물인 '안개'에 휩싸여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는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 속에서 그는 과거의 인물들을 만난다. 세무서장이 되어 속물로 변해버린 동창, 그리고 한때 연모했던 후배의 자살 소식은 그에게 무진 역시 더 이상 순수의 공간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그러던 중 그는 모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는 '하인숙'을 만난다. 그녀는 술자리에서 꽤 유명한 노래인 '목포의 눈물'을 부르며 서울로 떠나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속물적인 모습과 동시에 어딘가 자신과 닮은 공허함을 발견하고 하룻밤의 사랑을 나눈다. 무진의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현실 도피의 동반자를 발견한 것이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함께 서울로 가자고 제안한다.
3부: 도피의 끝, 아내의 편지
하인숙과 함께 무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짧은 환상은, 서울의 아내로부터 온 한 통의 전보로 산산조각 난다. "早歸. 急報(조귀. 급보)", 즉 "빨리 돌아오라. 급한 소식이다"라는 단 네 글자. 이 전보는 그에게 무진에서의 일탈이 끝났음을 알리는 '명령'이자, 그가 속한 현실 세계로의 '소환장'이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 끝에 하인숙을 무진에 남겨두고 서울행 버스에 오르기로 결심한다. 그의 도피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
4부: 무진을 떠나며, 그리고 남겨진 것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하인숙에게 남기고 온 편지를 떠올린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떠난다는, 지독히 위선적이고 변명에 가득 찬 문장이다. 그는 그 편지가 결국 하인숙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그는 이렇게 독백한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짧은 여정 끝에 남은 것은 사랑의 성취나 자유의 획득이 아닌, 자신의 비겁함과 속물근성을 확인한 '부끄러움'뿐이었다.
안개, 편지, 그리고 부끄러움
'안개'의 다층적 상징
'무진기행'에서 '안개'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①주인공의 혼란스러운 내면, ②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경계, ③일상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잠시 숨을 수 있게 해주는 익명성의 공간, ④그리고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 그 자체를 상징한다. 사람들은 무진의 안개 속에서 잠시 위안을 얻지만, 안개가 걷히면 결국 냉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일상으로의 복귀 명령, '편지(전보)'
아내의 전보는 소설의 흐름을 가르는 결정적 장치다. 그것은 주인공을 지배하는 현실 세계의 권력(아내와 장인으로 대표되는)을 상징하며, 개인의 낭만적 일탈이 얼마나 쉽게 현실의 질서 앞에 좌절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짧은 전보 앞에서 그의 모든 결심과 환상은 힘없이 무너진다.
현대인의 실존적 감각, '부끄러움'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무진기행'의 핵심 주제다. 이 부끄러움은 하인숙을 버린 것에 대한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다. 그것은 ①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속물근성에 대한 부끄러움, ②진정한 사랑이나 순수한 열정 대신 위선적인 변명으로 자신을 포장한 비겁함에 대한 부끄러움, ③그리고 결국 일상이라는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실존적 자기혐오다.
1960년대의 이방인, 윤희중과 우리
'무진기행'의 주인공 윤희중은 영웅도, 악인도 아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근대화의 길목에 서 있던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이 겪었던 정신적 방황을 대변한다. 그는 가난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싶어 하지만, 속물적인 성공 속에서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방인이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단지 1960년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어딘가 다른 곳'을 꿈꾸지만, 결국 책임과 안정이라는 현실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의 고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겹쳐진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무진'을 품고 산다. 그곳으로의 짧은 도피를 꿈꾸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와 어제의 삶을 반복한다.
김승옥은 바로 그 지점,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마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비겁함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의 감정을 놀랍도록 세련되고 감각적인 문체로 포착해냈다.
당신은 당신의 '무진'을 떠났는가
'무진기행'은 발표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진다. 일상에 안주하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당신의 '무진'은 어디이며, 그곳으로부터의 도피는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일상이라는 궤도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 있는 독자라면, 이 안개 자욱한 도시로의 짧은 여행을 떠나보길 권한다. 그 끝에서 당신은 아마도, 지독한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의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하고도 귀한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