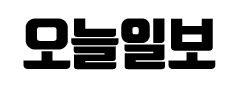- "사람 향한 유형력 행사라면 직접 닿지 않아도 유죄"
- 법조계, "위협·공포심 유발 행위도 처벌 대상 명확히 해"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향해 유리그릇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 비록 상대방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인 '유형력(物理力)의 행사'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힘의 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향후 폭행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위협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격분한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단단한 재질의 유리그릇을 B씨가 있는 방향으로 힘껏 던졌다. 그릇은 B씨의 머리 옆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으나, 다행히 B씨의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릇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벽을 보고 던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폭행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과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향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던진 그릇은 단단하고 크기가 있어 사람이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이라며 "피해자와 불과 1~2m 떨어진 지점에서 이러한 물건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즉, 사람을 맞힐 의도가 뚜렷했고, 빗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폭행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안 맞았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위협 행위도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시비는 물론,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보복 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협 행위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협하거나, 고의적으로 차량을 상대방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가 유발하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역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힘의 과시'와 '위협적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