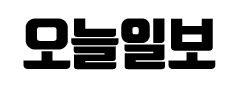- "오랑캐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 조선을 뒤흔든 박지원의 현장 보고서
조선 최고의 문장가이자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연암(燕巖)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 한 시대의 통념에 맞선 위대한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이 담긴 역작이다.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250년 전 한 선비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본다.
1780년 조선. 나라는 성리학이라는 단단한 이념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다. 지식인들은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의 나라'라 멸시하며,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 믿었다. '북벌(北伐)'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였지만, 청나라를 배우자는 주장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경(不敬)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 바로 그해 여름,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났으나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했던 아웃사이더,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 잔치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압록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는 5개월간의 여정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담아, 조선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권의 '현장 리포트'를 써 내려갔다. 바로 '열하일기(熱河日記)'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편견을 깨고 실용을 외친 한 위대한 지식인의 혁명적 제안서였다.
제1부: 편견의 땅에서 미지의 땅으로
박지원이 여행을 떠나던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소중화(小中華)', 즉 작은 중국이라는 자부심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가 만주족의 청나라에 멸망하자, 이제 중화문명의 정통성은 오직 조선에만 남았다는 선민의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 수도 연경(북경)을 방문하는 사신단의 마음은 복잡했다. 공식적으로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이었지만, 내심으로는 '오랑캐'의 땅을 밟는다는 치욕과 경멸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은 달랐다. 그는 44세가 되도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등 젊은 실학자들과 교류하며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법을 익혔다. 그에게 이번 여정은 마지못해 떠나는 길이 아니라, 조선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한양을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고, 요동 벌판을 지나 연경에 도착한 뒤, 황제의 여름 별궁이 있는 열하(熱河, 현재의 청더시)까지 향하는 1천여 킬로미터의 대장정에 오른다. 그리고 그의 눈은 궁궐의 화려함이 아닌, 청나라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그 속에 담긴 실용의 지혜를 향하고 있었다.
제2부: 벽돌 한 장, 수레 하나에 담긴 충격
'열하일기'가 위대한 이유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아주 작은 관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박지원이 받은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벽돌'이었다. 흙과 짚으로 집을 짓고 나무로 다리를 놓던 조선과 달리, 청나라는 집도, 성벽도, 다리도 모두 벽돌로 만들었다. 그는 벽돌이 운반과 보관이 쉽고, 견고하며, 제작 기술만 보급되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건축 자재임을 간파했다. 그는 조선이 쓸데없는 명분에 사로잡혀 실용을 놓치고 있음을 통탄했다.
두 번째 충격은 '수레'였다. 청나라의 넓은 길 위로는 수많은 수레가 쉴 새 없이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다. 잘 닦인 도로망과 규격화된 수레가 유통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조선의 수레는 좁은 길 때문에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바퀴의 폭마저 제각각이라 효율이 떨어졌다. 박지원은 "수레를 이용하지 않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유통과 상업을 천시하는 조선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보고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직접 청나라 학자, 상인, 농민들과 필담을 나누며 그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실용적인 지식에 감탄했다. 그에게 청나라는 더 이상 오랑캐의 나라가 아니라, 조선이 반드시 배워야 할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다. 이 모든 깨달음이 실학사상의 핵심인 '이용후생(利用厚生,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하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으로 집약되었다.
제3부: "법고창신", 열하에서 조선의 미래를 보다
열하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에 던질 메시지를 정리했다. 그것이 바로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이다. 이는 '옛것을 본받되, 그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가 말하는 '옛것(古)'은 맹목적인 명나라 숭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청나라의 발전된 현실 그 자체가 조선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古)'였다.
그는 청나라의 벽돌, 수레, 시장, 화폐 시스템 등 실용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오랑캐에게 배울 것은 없다"는 조선 지배층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당연히 그의 주장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국왕이었던 정조는 박지원의 문체가 순정하지 못하고 저속하다며 '문체반정(文體反正)'을 통해 그의 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의 파격적인 생각과 표현 방식이 조선의 전통적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열하일기'는 금서(禁書)처럼 취급받으며 한동안 양지에서 논의될 수 없었다.
제4부 결론: 250년 전의 질문,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비록 당대에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열하일기'는 암암리에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며 실학사상의 '교과서'가 되었다.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후대의 개혁 사상가들은 '열하일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떴다. 박지원은 조선 최초의 '중국 통신원'으로서, 편견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자국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250년이 지난 오늘날, '열하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익숙한 편견과 낡은 명분에 사로잡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가치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박지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을 추구하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한,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한 화두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